와르르 무너지는 60년 원자력 신화
김동호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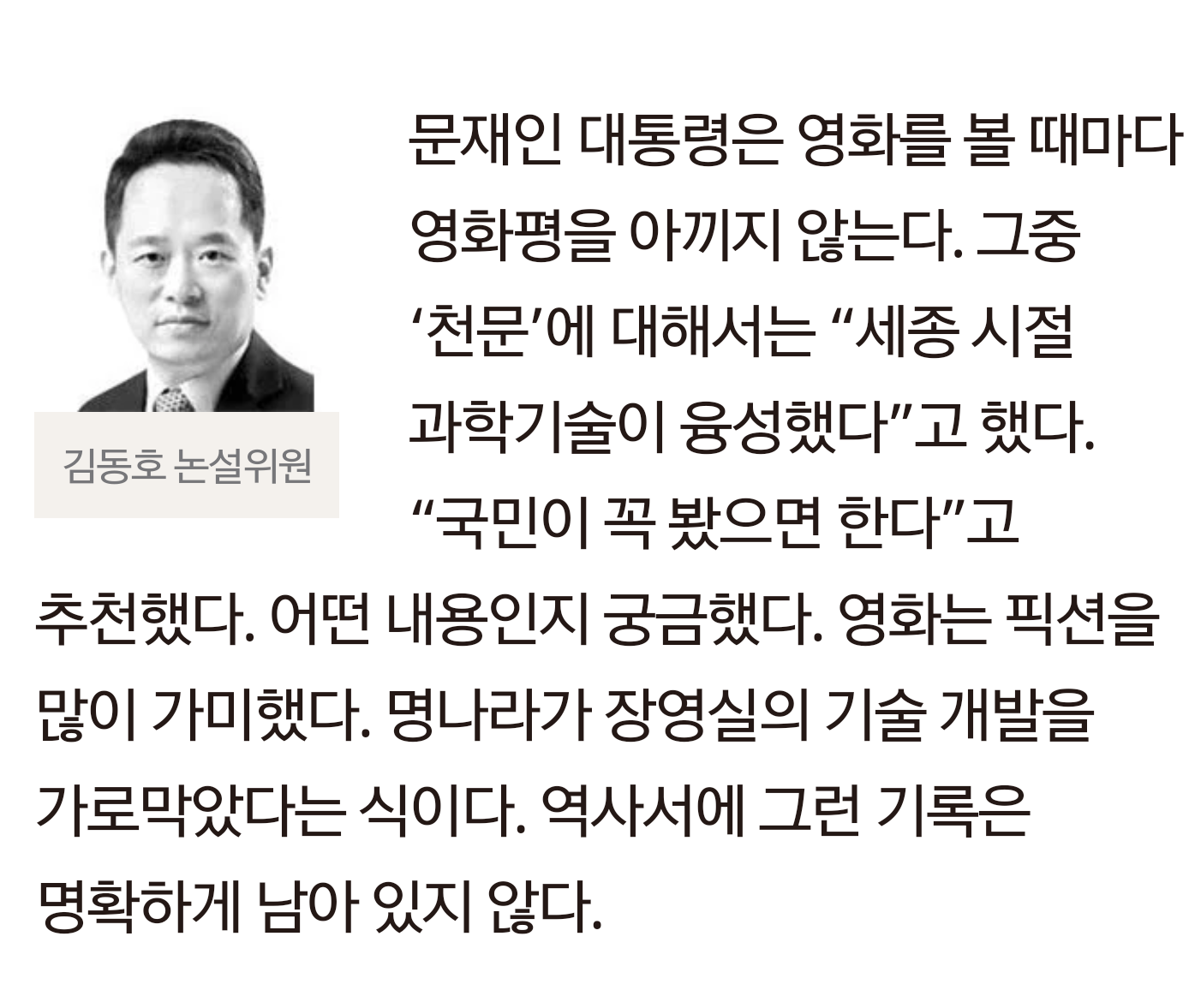
오히려 영화의 행간으로 보면 당시 천문 연구를 반대한 세력은 조선의 지배계층이었다. 사대부로 불리는 이들은 철저히 중화사상을 추종했다. 사대부의 전유물처럼 중국 문자와 역법을 써왔는데 굳이 조선의 것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다. 이런 풍토에서 한글과 천문 기구를 발명한 것은 세종의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터다.
탈원전 폭주의 청구서 몰려와
한국전력 적자, 두산중 초토화
지금 당장 탈원전 폭주 멈춰야
생각이 이렇게 꼬리를 물자 천덕꾸러기가 된 원자력의 처지가 떠올랐다. 원자력은 한국이 반도체와 함께 세계 정상에 오른 “과학기술 융성”의 결정체다. 씨앗은 1957년 이승만 정부에서 뿌렸다. 미국의 기술·자금 지원 없이 우리 의지와 노력만으로 원자력 개발에 나서야 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숙명이었다. 그로부터 60년 만에 한국은 세계 최고가 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한국형 APR 1400 모형은 안전성이 높아 미국·유럽에서도 설계 인증을 받았다. 그야말로 “과학기술의 융성”이다.
안타깝게도 60년 원자력 신화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 현 정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신규 건설 6기(基)를 백지화했다. 셰일가스가 펑펑 쏟아져 에너지 걱정이 없는 미국이 원전을 수리해 최장 80년까지 가동하는 것과 정반대다. 현 정부 들어 2017년 폐쇄한 고리 1호기는 연장된 수명을 채웠으니 그렇다 치자. 하지만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수리해 2022년까지 쓸 수 있는데도 폐쇄했다. 폐쇄 과정은 난폭했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자 “가동률이 낮다”고 경제성을 들이대며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폐쇄를 확정했다.
현 정부는 1기 건설에 4조~5조원 드는 원전을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다. 제정신이면 이럴 수 없다. 국회는 여론이 악화하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청구를 의결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지난달 시한을 넘기고도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또 현 정부는 탈원전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우기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꼼수다. 두산중공업은 원전 발주 취소의 직격탄을 맞아 휴업에 나섰고, 눈물의 명퇴를 받고 있다.
아무리 원전을 깎아내려도 장점은 감출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에서도 방사선 누출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한국형 원전은 비행기와 충돌해도 방사선이 누출되지 않게 설계됐다. 문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판도라’는 픽션의 세계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의 부작용이다. 태양광은 발전 효율이 높아야 24%에 불과하다. 더구나 생산된 전력을 다른 곳으로 보내려면 송전선로를 새로 깔아야 한다. 무엇보다 막대한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다. 풍력 역시 설치비가 비싸고 소음 문제도 심각하다.
거액의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이 지난해 1조3566억원의 거대 적자를 낸 것도 탈원전의 부작용이다. 80~85%에 이르던 원전 가동률이 70%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결과다. 전기요금 인상은 시한폭탄이다. 억지 탈원전을 고집하면 비용이 51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논문(정용훈 KAIST 교수)까지 나왔다.
탈원전 원리주의자들은 프랑스가 원전 비중을 72%에서 50%로 줄이기로 했다는 데 주목한다. 그러나 50%는 탈원전이 아니다. 한국은 비중이 30%에 불과하다. 영화 천문에서 세종은 사대부의 반발에 밀려 과학장비를 “불사르라”고 했다. 원전의 처지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 품 안의 보물을 불사르지는 말자. 곧 오르게 될 전기요금을 대신 내주지 않을 거면.
중앙일보
케이콘텐츠








